[이세하] 도와줄까?
루이벨라 2017-05-1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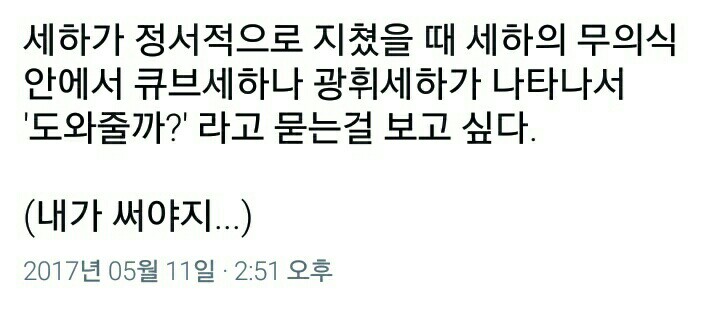
※ 임시본부 챕터1 중간 부분 시점
※ 짧게 썼습니다
"..."
잠에서 깼다. 그뿐, 눈을 뜬건 그로부터 한참이나 지난 때였다. 눈을 감고는 있었지만 의식은 깨어있는...이 미묘한 기분. 한참을 눈을 감은 채 바르작거렸다.
눈을 뜨고서야 내 몸이 침대 위에 누워져있다는 걸 겨우 자각하게 되었다. 내가 왜 침대에 누워있었더라...? 아, 맞아. 근래 들어 피곤한 일이 많았다. 그 일들을 처리할 인원이 매우 제한적이었기에 요즘 들어 제대로 된 잠을 ** 못했다.
겨우 한숨을 트일 시간이 생기자, 유정이 누나는 나에게 잠깐 눈이라도 붙이라는 제안을 했다. 난 의아했다. 나 말고, 여기 있는 팀원들 모두 다 나와 같이 며칠 밤을 새고 임무에 임했는데 나에게만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 이상한 건 그 뿐이 아니었다. 검은양 팀원들은 물론, 협력 관계에 있는 늑대개 팀원들도 나에게 잠시 잠이라도 잘 것을 권장했다. 심지어 나만이 제대로 된 휴식을 가지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진 이들은 한명도 없었다.
난 미안하기도 하고, 아직 내가 해야할 일이 남아있었기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랬더니 이슬비를 비롯한 몇몇이 벌컥 화를 내며, 나를 반강제적으로 침대에 눕혔다.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든 모양이었다. 그 뒤의 기억은 전혀 없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이슬비와 서유리가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을 하겠다고 침대 맡에 버티고 있었는데 없는 것으로 보아 내가 잠을 꽤나 길게 잔 모양이었다.
기분이 몽롱했다. 내 몸은 더 자고 싶다고 나에게 호소를 하였다. 그 부탁을 나는 따르기로 결심했다. 요즘 들어 많이 피곤하기는 했다, 라는 답지 않은 핑계거리를 대면서.
그래, 요새 많이 피곤했어. 모처럼 쉬라고 준 타이밍에 쉬어주는 게 맞는 도리겠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걸까.
혹시 난 지금 무언가를 애써 잊으려고 하는게 아닐까.
감겨지는 눈꺼풀 뒤로 냉소를 띄우고 있는 낯익은 인영 하나가 보였다.
* * *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나만 있었다.
꿈이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이다.
난 꿈 같은 건 잘 꾸지 않는 아이였다. 잠을 적게 자기도 했지만, 꿈에서라도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도 없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꿈을 많이 꾸기는 했었다. 하지만 좋은 꿈을 꾼 적은 없었다. 어린 아이가 꾸는 꿈답게 대체로 추상적이었다. 주위에서 섬뜩한 목소리들이 나를 괴롭히는 꿈이거나, 깨어나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 괴물에게 쫓기는 꿈이라던가. 여하튼 그랬다.
내가 꾸는 모든 꿈은 내용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공통점 하나는 있었다. 꿈 속에서는 언제나 나 혼자라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덩그러니 있던 적은 처음이었지만, 그리 낯설지 않았다.
난 그대로 자리에 앉았다. 이곳에 가만히 있으면...언젠가는 꿈에서 깨겠지? 이 꿈 속에서 느낀 시간이 길어도 실제로는 짧은 시간이라는 걸 나는 안다. 꿈일뿐인데, 피부로 느껴지는 한기는 싸늘했다.
그렇게 마냥 꿈에서 깨어나길 기다리자니, 여러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꿈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짧은 시간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똑같은 생각을 골똘히 해본적은 근래에 없었다.
아까 다시 잠들기 직전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부러 잊고 있는게 있는것 같이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것을 떠올리고 말았다.
"...**."
자연스럽게 욕지거리를 해버렸다. 그 말을 내뱉는 동시에, 온몸에 기운이 쭉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누워버렸다. 누운 채로 바튼 숨을 내쉬었다.
역시, 억지로 잊고 있었던 건 이유가 다 있었던거야. 애써 잊으려고 했지만, 그덕에 요즘의 나는 생각같은 '생각' 을 하지 못했던 걸수도 있었다.
차라리 그 편이 더 좋았는데.
"...힘들어."
차마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 없었던 나의 심정을 이곳에서라도 털어놓았다. 아, 혹시 유정이 누나가 일부러 나한테만 쉬라고 했던 이유가 내가 힘들어보였기 때문일까.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괜찮은 척, 무진 애를 썼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은 똑바로, 나를 향해 정확히 걸어왔다. 누가 오는걸까. 내 꿈에서 다른 누군가가 나온적이 없어서 누가 다가오고 있는지는 가늠이 오지 않았다. 말했지 않은가. 내 꿈에는 언제나 '나' 혼자였다고.
"..."
"..."
누워있는 내 얼굴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눈을 감고 있었던 건 아니라, 그 그림자의 주인공이 누군지 처음부터 알 수 있었다. 분명 놀라워해야하는 게 정상일터인데, 이상하게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다. 전혀 상상도 못한 인물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말이다.
'그 사람' 은 누워있는 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 비꼬는 듯한 미소에 위안을 가지게 되는 게 참 아이러니했다. '그 사람' 은 두 손으로 내 얼굴을 쓰다듬으려는 듯 감싸더니 입을 열었다.
"그럼..."
참 익숙한 목소리다.
"도와줄까?"
꿈 속에서도 또 잠을 잘 수 있는걸까. 또 꿈을 꿀 수 있는걸까. 가능할 거 같았다.
나와 똑같이 생긴 얼굴을 마주보며 난 잠에 몸을 맡겼다.
* * *
"어?! 세하다!"
유리의 외침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같은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유리의 말 그대로 세하가 다가오고 있었다. 세하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유정은 입을 열었다.
"세하야, 벌써 이렇게 나와도 되니? 힘들면 조금만 더 쉬어도 되는데..."
"괜찮아요, 유정이 누나."
재빠르게 유정의 말을 자르는 세하를 보며 주변에 있던 이들의 동공이 살짝 커졌다. 왜인지는 모르지만 평소의 세하, 그리고 요즘의 세하와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세하는 웃음기 머금은 표정으로 덧붙였다. 목소리는 노래를 부르듯, 다 털어버린 듯 가볍기까지 했다.
"이미 푹.쉬.고.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세하의 눈이 붉게 보인건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일반] [일반]](https://storage.closers.me/files/no_img.png)
![[일반] [일반]](https://storage.closers.me/files/fanfic/df/dfa1af428ff9fb30f04d5bae29aaafc2.jpg)